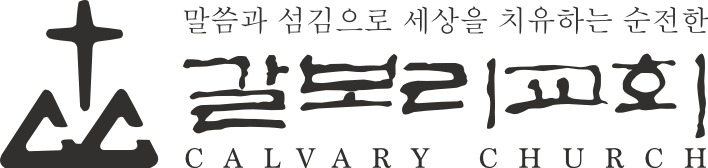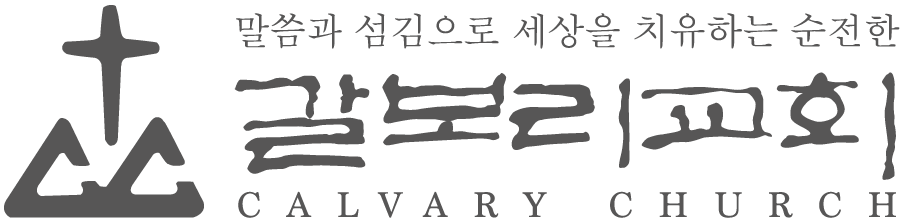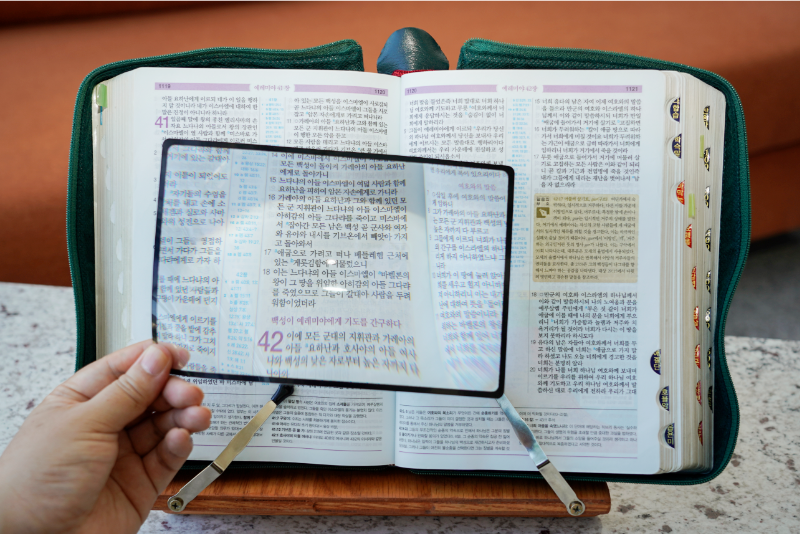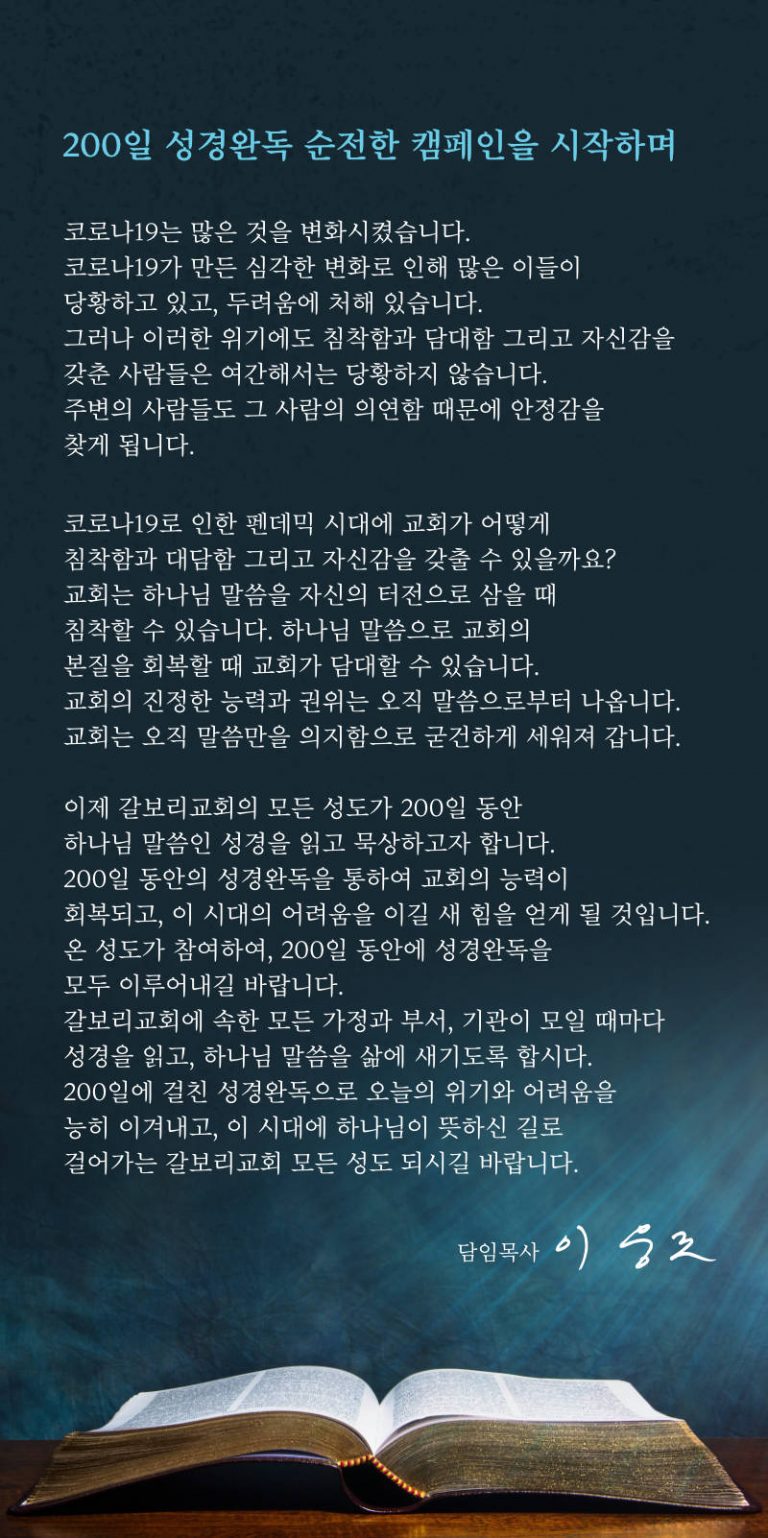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바벨론’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론’이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이곳을 장소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 있던 마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 같은 이름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도 ‘바벨론’은 탄압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신의 수신자들은 터키에 속한 타우루스 산 북쪽 다섯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으며 당시에는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이 단어를 ‘천국을 떠나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서신의 내용을 보면 수신자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네로 황제 때인 주후 54-68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울의 순교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네로 박해 바로 전인 주후 64-65년 전에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베드로는 이 서신을 썼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가르침은 세속적인 문화적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베드로전서는 적대적인 이방 땅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쓰여진 안내서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올바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영원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도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순히 관점을 변화시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도 그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나가야 한다는 핵심적인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다가오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 기간은 ‘잠깐’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 속 하나님의 백성들과 현재 교인들과의 유사성을 부각시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룩이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고난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경험했던 삶은 구약과 신약을 성경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집트에 살았던 요셉이나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신의 수신자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